APEC Healthy Aging 세션 참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APEC 고령화 건강 회의(Healthy Aging 세션)에 참석했다. 회의장 스크린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Silver tsunami에서 Golden opportunity” 라는 문구와 함께, 고령화 사회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메시지가 강조되었다.
슬라이드에는 고령화가 가져올 다섯 가지 축이 제시되었다.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Workforce participation), ▲돌봄(Caregiving), ▲소비(Consumer spending), ▲자원봉사(Volunteering),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쳤을 때 약 118조 달러(세계 GDP의 39%) 규모로 예상되는 ‘실버 이코노미’였다.
또 다른 화면에서는 주거·보건의료·재정 안정·사회서비스·교육·교통과 같은 영역이 하나의 원으로 묶여, “Whole-of-Society Approach”라는 이름으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는 회원국들이 헬시 에이징을 공동 우선 과제로 삼고, 자료 공유와 역량 강화를 통해 협력할 것을 제안하는 문구가 이어졌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고령화를 단순히 의료문제로 좁히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 과제로 다루고 있었다.
한국 헬시 에이징 정책 발표, 통합 없는 ‘통합 전략’과 헬시 에이징 정책
APEC 고령화 건강 회의에서 한국 대표 발표를 들으며 아쉬움을 느꼈다. 발표의 첫 번째 전략으로 ‘재택의료(in-home care)’가 제시되었는데, 병원 내 서비스와 재택 서비스를 단순히 화살표로 연결한 그림을 ‘통합 서비스’로 설명한 점은 통합(integration)의 본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다.
발표의 첫 번째 전략으로 ‘재택의료(in-home care)’가 제시되었는데, 병원 내 서비스와 재택 서비스를 단순히 화살표로 연결한 그림을 ‘통합 서비스’로 설명한 점은 통합(integration)의 본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다.
통합은 단순히 의료서비스의 연장을 뜻하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건강한 노화 전략은 의료와 돌봄, 복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다차원적 연결망이다. 영국의 NHS,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WHO의 ICOPE 모두가 의료 체계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함께 엮어 고령자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접근은 아직 의료 중심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전략이 국가적 청사진이라기보다 일부 전문가와 관료의 견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이 권위 중심의 구조 속에서 집단지성보다는 소수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 결과 국제무대에서 우리 전략이 아주 풍부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소수의 목소리를 통한 정책 개발 현상은 10여 년 간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자주 체감해 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통합의 새로운 정의를 향해
고령화는 특정 집단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다. 이제는 권위적 의사결정 구조를 넘어, 현장과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평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진정한 통합은 병원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국민의 삶 전반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국가적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 나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다. 보건의료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케어(care)”의 개념이 사회복지학을 통해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동시에 구체화되고 있음을 느낀다. 이제 케어는 단순히 진료나 간호가 아니라, 삶의 전반을 지탱하는 사회적·제도적 기반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가 같은 부처(보건복지부)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두 영역이 긴밀하게 협력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관점 차이와 언어적 단절이 존재한다. 앞으로 헬시 에이징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이해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의료·복지·지역사회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조율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고령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노화 전략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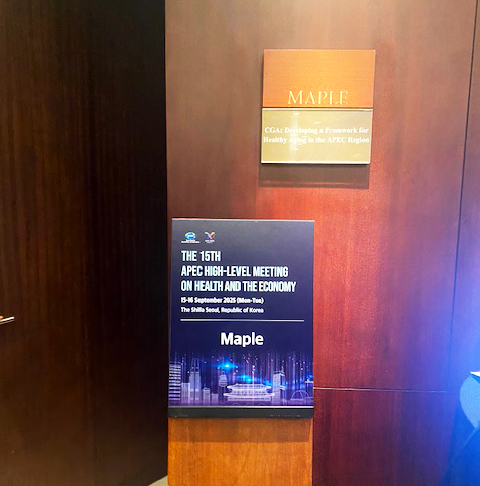 APEC Healthy Aging 세션 참가최근 서울에서 열린 APEC 고령화 건강 회의(Healthy Aging 세션)에 참석했다. 회의장 스크린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Silver tsunami에서 Golden opportunity” 라는 문구와 함께, 고령화 사회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메시지가 강조되었다.슬라이드에는 고령화가 가져올 다섯 가지 축이 제시되었다.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Workforce participation), ▲돌봄(Caregiving), ▲소비(Consumer spending), ▲자원봉사(Volunteering),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쳤을 때 약 118조 달러(세계 GDP의 39%) 규모로 예상되는 ‘실버 이코노미’였다.또 다른 화면에서는 주거·보건의료·재정 안정·사회서비스·교육·교통과 같은 영역이 하나의 원으로 묶여, “Whole-of-Society Approach”라는 이름으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는 회원국들이 헬시 에이징을 공동 우선 과제로 삼고, 자료 공유와 역량 강화를 통해 협력할 것을 제안하는 문구가 이어졌다.이처럼 국제사회는 고령화를 단순히 의료문제로 좁히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 과제로 다루고 있었다.한국 헬시 에이징 정책 발표, 통합 없는 ‘통합 전략’과 헬시 에이징 정책APEC 고령화 건강 회의에서 한국 대표 발표를 들으며 아쉬움을 느꼈다. 발표의 첫 번째 전략으로 ‘재택의료(in-home care)’가 제시되었는데, 병원 내 서비스와 재택 서비스를 단순히 화살표로 연결한 그림을 ‘통합 서비스’로 설명한 점은 통합(integration)의 본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다.발표의 첫 번째 전략으로 ‘재택의료(in-home care)’가 제시되었는데, 병원 내 서비스와 재택 서비스를 단순히 화살표로 연결한 그림을 ‘통합 서비스’로 설명한 점은 통합(integration)의 본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다.통합은 단순히 의료서비스의 연장을 뜻하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건강한 노화 전략은 의료와 돌봄, 복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다차원적 연결망이다. 영국의 NHS,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WHO의 ICOPE 모두가 의료 체계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함께 엮어 고령자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접근은 아직 의료 중심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전략이 국가적 청사진이라기보다 일부 전문가와 관료의 견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이 권위 중심의 구조 속에서 집단지성보다는 소수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 결과 국제무대에서 우리 전략이 아주 풍부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소수의 목소리를 통한 정책 개발 현상은 10여 년 간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자주 체감해 왔던 부분이기도 하다.통합의 새로운 정의를 향해고령화는 특정 집단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다. 이제는 권위적 의사결정 구조를 넘어, 현장과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평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진정한 통합은 병원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국민의 삶 전반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국가적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최근 나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다. 보건의료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케어(care)”의 개념이 사회복지학을 통해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동시에 구체화되고 있음을 느낀다. 이제 케어는 단순히 진료나 간호가 아니라, 삶의 전반을 지탱하는 사회적·제도적 기반으로 이해되고 있다.우리나라는 현재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가 같은 부처(보건복지부)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두 영역이 긴밀하게 협력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관점 차이와 언어적 단절이 존재한다. 앞으로 헬시 에이징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이해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궁극적으로는 의료·복지·지역사회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조율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고령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노화 전략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APEC Healthy Aging 세션 참가최근 서울에서 열린 APEC 고령화 건강 회의(Healthy Aging 세션)에 참석했다. 회의장 스크린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Silver tsunami에서 Golden opportunity” 라는 문구와 함께, 고령화 사회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메시지가 강조되었다.슬라이드에는 고령화가 가져올 다섯 가지 축이 제시되었다.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Workforce participation), ▲돌봄(Caregiving), ▲소비(Consumer spending), ▲자원봉사(Volunteering),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쳤을 때 약 118조 달러(세계 GDP의 39%) 규모로 예상되는 ‘실버 이코노미’였다.또 다른 화면에서는 주거·보건의료·재정 안정·사회서비스·교육·교통과 같은 영역이 하나의 원으로 묶여, “Whole-of-Society Approach”라는 이름으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는 회원국들이 헬시 에이징을 공동 우선 과제로 삼고, 자료 공유와 역량 강화를 통해 협력할 것을 제안하는 문구가 이어졌다.이처럼 국제사회는 고령화를 단순히 의료문제로 좁히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 과제로 다루고 있었다.한국 헬시 에이징 정책 발표, 통합 없는 ‘통합 전략’과 헬시 에이징 정책APEC 고령화 건강 회의에서 한국 대표 발표를 들으며 아쉬움을 느꼈다. 발표의 첫 번째 전략으로 ‘재택의료(in-home care)’가 제시되었는데, 병원 내 서비스와 재택 서비스를 단순히 화살표로 연결한 그림을 ‘통합 서비스’로 설명한 점은 통합(integration)의 본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다.발표의 첫 번째 전략으로 ‘재택의료(in-home care)’가 제시되었는데, 병원 내 서비스와 재택 서비스를 단순히 화살표로 연결한 그림을 ‘통합 서비스’로 설명한 점은 통합(integration)의 본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다.통합은 단순히 의료서비스의 연장을 뜻하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건강한 노화 전략은 의료와 돌봄, 복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다차원적 연결망이다. 영국의 NHS,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WHO의 ICOPE 모두가 의료 체계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함께 엮어 고령자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접근은 아직 의료 중심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전략이 국가적 청사진이라기보다 일부 전문가와 관료의 견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이 권위 중심의 구조 속에서 집단지성보다는 소수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 결과 국제무대에서 우리 전략이 아주 풍부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소수의 목소리를 통한 정책 개발 현상은 10여 년 간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자주 체감해 왔던 부분이기도 하다.통합의 새로운 정의를 향해고령화는 특정 집단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다. 이제는 권위적 의사결정 구조를 넘어, 현장과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평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진정한 통합은 병원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국민의 삶 전반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국가적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최근 나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다. 보건의료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케어(care)”의 개념이 사회복지학을 통해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동시에 구체화되고 있음을 느낀다. 이제 케어는 단순히 진료나 간호가 아니라, 삶의 전반을 지탱하는 사회적·제도적 기반으로 이해되고 있다.우리나라는 현재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가 같은 부처(보건복지부)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두 영역이 긴밀하게 협력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관점 차이와 언어적 단절이 존재한다. 앞으로 헬시 에이징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이해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궁극적으로는 의료·복지·지역사회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조율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고령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노화 전략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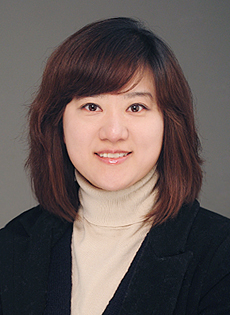 김희선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글쓴날 : [25-09-18 09:46]
김희선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글쓴날 : [25-09-18 09:46]